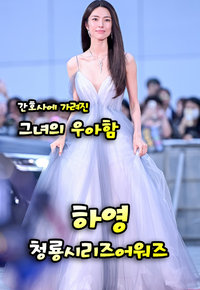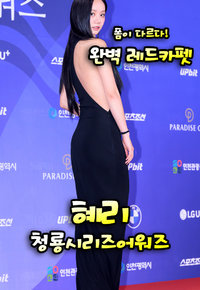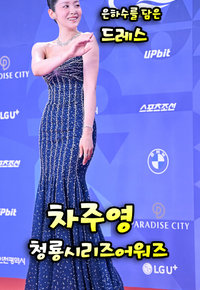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에 한국영화 대작들은 여전히 개봉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다. 중소규모의 영화들이 때때로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주로 할리우드 영화들이 국내 극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3년차. 바이러스의 확산 이후 국내 영화산업에 일었던 큰 변화가 점차 일상으로 굳어지고 있다. 극장 개봉하는 한국영화 편수가 현격히 줄어듦과 동시에 ‘사냥의 시간’(2020), ‘승리호’(2021), ‘낙원의 밤’(2021), ‘모럴센스’(2022), 등이 넷플릭스 공개됐고 지난해에는 ‘서복’, ‘미드나이트’, ‘해피 뉴이어’가 극장과 티빙에서 동시 개봉했다. 그 사이 넷플릭스, 티빙, 왓챠, 웨이브 등 OTT 제작 드라마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더 커졌다.
물론 영화관 관람은 휴대전화나 주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다는 점에서 쾌감을 느끼는 일이다. 집에서 보는 건 장애물이 많아 중단없이 한 편을 보기 힘든 데다, 이 작품 저 작품 떠돌다가 남는 게 없는 노마드족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신성시되던 극장 관람 문화가 조심스럽게 해체되고 있다. ‘영화보기’라는 개념 자체에 변화가 찾아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집에서도 볼거리가 많아졌기에, 극장이라는 공간이 주는 힘을 부정하기 어려움에도, 굳이 나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자리잡은 것이다. 또한 극장 개봉 후 VOD 및 OTT로 향하는 홀드백이 확연히 짧아졌기에 관성처럼, 습관적으로 극장을 찾던 일도 뜸해졌다. 어떤 작품에 대단한 재미가 보장되지 않는 한 ‘반드시 극장에서 봐야 한다’는 암묵적인 믿음이 깨진 것이다. 이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마찬가지일 터.

결국 현재의 위기는 영화와 드라마를 즐기는 관객들의 몫이 아니다. 극장을 사수할 것이냐, OTT의 판을 더 키울 것이냐, 판가름하는 국내 상업예술 주체에게 있다. 혼돈의 시기 속 국내 영화제작자, 극장들이 코로나 이후에도 기존의 방식을 고수할 것인지 선택의 문제가 된 셈이다.
극장 매출은 한국영화 산업 전체 매출의 약 7~80%를 차지한다. 관객이 극장에서 티켓을 사면 영화발전기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극장, 제작자, 배급사, 투자사로 배분된다. 극장 관객이 줄어들면 영화산업에 속한 자금 흐름이 타격을 받는 구조다.
한 관계자는 OSEN에 “현재 극장 개봉을 미루고 있는 한국영화들이 많아서 투자자들도 한계에 부딪혔다. 2~3년간 수익이 있었어야 새 작품에 투자하지 않겠냐”며 “그래서 오로지 극장 개봉만을 목표로 새 영화를 만들고 있는 영화제작사가 몇 군데 없다”고 말했다. 흥행수익을 꾸준히 내온 국내 대형 제작사가 아니고서야 극장 개봉용 영화를 만들기 어렵게 됐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수많은 제작사들이 돈이 되는 드라마 제작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딜 가든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라서 더 안타깝다. 극장 개봉용으로 만든 영화가 사후 OTT 플랫폼으로 진입하기 어려울 뿐더러 작품마다 다르지만, 제작비를 상회하는 일정 수익만 얻을 수 있다. 극장 흥행으로 얻게 될 수익의 규모는 절대 따라갈 수는 없다는 것.
또한 넷플릭스 등 여러 OTT들도 마냥 탄탄대로는 아니기에 사업 초기와 달리 쪼개기 공개 방식, 전략적 작품 공개로 살길을 모색하고 있다.
그렇기에 앞으로 코로나 이전과 같은 문화가 재현될 순 없겠으나, OTT 플랫폼이 극장을 무너뜨릴 일은 없다. 두 개가 각자의 방식대로 공존할 것이다. 오미크론 상황이 안정되면 영화를 극장에서 보려는 수요가 있을 터다.(인기 배우 캐스팅을 떠나 재미가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좋은 작품은 휴대전화로 작게 보든, 스크린으로 크게 보든 호평이 따른다는 점이다. 다만, 어느 쪽이 더 돈이 되는가 고민하겠지만.
/ purplish@osen.co.kr
[사진]ⓒ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